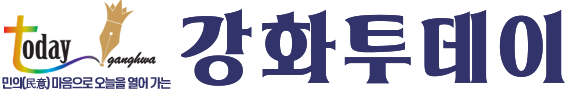- 전)양곡고등학교 역사 교사
조선시대에 규모가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는 현입니다. 현 위에 군, 도호부, 주 등이 있었습니다. 주(州)의 역사는 꽤 길어요. 통일신라 ‘9주 5소경’의 9주가 많이 알려졌지요. 이후 전국적으로 ‘-주’라는 지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도 지방 큰 도시 지명에 ‘주’가 붙은 곳이 여럿입니다.
조선 태종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주의 수를 크게 줄이는 방법으로 주의 격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줄였을까요? 지명을 ‘-주’ 대신 ‘-산’이나 ‘-천’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울주가 울산이 되고 포주가 포천이 되었습니다. 괴주가 괴산이 되고 인주가 인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를 ‘-목’으로 불렀습니다. 나주목, 전주목…. 그래서 주의 수령을 목사(정3품)라고 했습니다.
조선 8도의 명칭은 대개 그 지방 큰 도시의 지명을 합한 것입니다. 충청도는 충주+청주, 전라도는 전주+나주, 경상도는 경주+상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현의 수령은 현감일까요, 현령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작은 현의 수령은 현감(종6품), 좀 큰 현은 현령(종5품)입니다. 군은 군수(종4품), 도호부는 도호부사(종3품)입니다. 도호부사를 줄여서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강화가 강화유수부가 되기 전에는 도호부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수령을 강화부사라고 했습니다.
《경국대전》(1485)에 따르면, 당시 조선 지방관 정원이 329명이었습니다. 현감 141명, 현령 34명, 군수 82명, 도호부사 44명, 목사 2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도호부사 4명과 부윤 4명이 더해져 329명입니다.
현감, 현령, 군수, 부사, 이런 지방관들을 원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또라고도 했고요. 지방관을 통틀어 원(員)이라고 했는데 원님은 ‘원’을 높여 부른 말입니다. 임금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사도(使道)라고도 했는데, 사도를 사또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위수여는 심주 강화현 사람[韋壽餘, 沁州江華縣人]으로 행동이 단아하고 성실했으며 법도를 잘 지켰다.”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수여라는 이가 심주의 강화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화의 다른 이름이 심주(沁州)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수여가 1012년(현종)에 사망했으니까, 고려 초에 이미 심주가 강화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심(沁) 자의 뜻은 ‘스며들다, 배어들다’입니다. 왜 강화를 심주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심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심주의 강화현이라고 했으니, 강화에 다른 현도 있다는 얘기겠죠? 당시 심주에 강화현의 영현(領縣, 거느린 현)으로 하음현(河陰縣), 교동현(喬桐縣), 진강현(鎭江縣)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이지만, 강화현에만 수령이 파견됩니다. 하음현·교동현·진강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강화현 수령이 나머지 3현을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음현은 지금 하점, 교동현은 교동, 진강현은 양도 지역과 비슷할 겁니다.
1232년(고종 19)에 고려 조정이 강화로 천도합니다. 몽골 침략에 맞서려는 겁니다. 이제 고려의 도읍지가 개성에서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고려의 새로운 수도 강화를, ‘강화 도읍’이라는 의미의 강도(江都)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개성으로 환도한 뒤에도, 이후 조선시대에도 강화는 계속 강도로 불렸습니다.
강화가 강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심주는 심도(沁都)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강화’, ‘강도’만큼이나 ‘심도’라는 지명이 많이 쓰였습니다. 화남 고재형 선생의 강화 기행집 제목도 《심도기행(沁都紀行)》(1906)입니다.
특히 ‘심(沁)’이라는 글자는 강화를 가리키는 상징어였습니다.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심(沁)’은 대개 강화를 의미합니다. 심영(沁營)은 강화 진무영이요, 심유(沁留)는 강화유수입니다.
“지금 청대하고 있는 것은 심의 일[沁事] 때문인 듯한데, 이것이야말로 어찌 최근 들어 망령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정조실록》에 실린 정조의 말입니다. 심의 일, 심사(沁事)는 ‘강화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가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한양(漢陽)의 ‘한’이 서울만을 상징할 수 없으며, 인천(仁川)의 ‘인’이 인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주(沁州)의 ‘심’은 강화만을 가리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강화에서 ‘심(沁)’은, 그리고 ‘심도(沁都)’는 거의 죽은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도중학교, 심도파출소(심도지구대) 정도입니다. 굴뚝만 남고 역사가 되어버린 심도직물도 있네요.
자, 이제 심주의 한자 표기를 다시 봅시다. 沁州!
어딘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길 ‘주(州)’는 지방 큰 도시 지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물론 고려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강화 천도 이전까지 강화의 행정구역 명칭은 ‘현’이었습니다. 천도 이후에야 군(郡)으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강화‘현’과 심‘주’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사료에서 강화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쓴 심주(沁洲)가 보입니다. 한자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州’가 아니라 氵+州=‘洲’입니다. 이 주(洲)자는 섬[島]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왠지 ‘州’보다 ‘洲’가 강화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처음에는 강화를 沁洲라고 했을 것인데 이후 沁州로 쓰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심주의 한자 표기는 당연히 沁州라고 여기게 된 것은 아닐까? 저는 ‘沁洲’라는 강화 옛 지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음현이 하점면이 되고, 진강현이 양도면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현재 강화군에는 1읍 12면이 있습니다.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에도 지금 이름으로 부르던 지역은 선원면(仙源面), 불은면(佛恩面), 길상면(吉祥面), 내가면(內可面)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대략 조선시대 부내면(府內面)이 장령면(長嶺面)과 합해서 지금의 강화읍(江華邑)이 되었습니다. 양도면(良道面)은 상도면(上道面)과 위량면(位良面)이 합해진 것입니다. 위량의 ‘양’과 상도의 ‘도’를 따서 ‘양도’로 이름 지은 것이죠.
하음면(河陰面), 간점면(艮岾面), 외가면(外可面)은 하점면(河岾面)이 되었습니다. 송정면(松亭面)과 삼해면(三海面)을 합친 것이 송해면(松海面)입니다. 북사면(北寺面)과 서사면(西寺面)을 합하면? 그렇지요, 양사면(兩寺面)입니다.
교동은, 조금 복잡하네요. 조선시대 교동은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상주산이 있는 송가도(松家島)도 교동 소속이었습니다. 간척으로 송가도가 석모도와 합쳐졌어도 여전히 송가도는 교동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서 송가도 지역이 삼산면으로 이관됩니다. 한편 동면과 남면이 화개면(華蓋面)이 되고 북면과 서면이 수정면(水晶面)이 됐다가 이후 화개면과 수정면을 합쳐 교동면(喬桐面)이 되었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석모도 지역이 삼산면(三山面)이 됩니다. 산이 셋이라서 삼산이라고 했다는데요, 그 세 산은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입니다. 주문도, 볼음도 등은 한때 제도면(諸島面)으로 불리다가 서도면(西島面)이 되었습니다.
부내면과 장령면이 지금 강화읍 지역이라고 했지요. 부내면은 읍내이고요, 장령면은 옥림리, 용정리, 갑곳리(甲串里), 월곳리(月串里)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또 한자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甲串’, ‘月串’. 한글로 갑곶, 월곶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상 공식 지명은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갑곳리’입니다. 월곶리를 월곳리로, 갑곶리를 갑곳리로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김포는 제대로 월곶면(月串面)으로 씁니다.
바로 잡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갑곳리를 갑곶리로, 월곳리를 월곶리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 쓰는 시대에 지번 주소를 굳이 고쳐야 할까?
예, 정말 요즘은 ‘○○리 ○○번지’ 식의 지번 주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고요, 특히 일정 구역을 말할 때는 지번 주소가 절대적으로 편합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누굴 만나서 묻는다고 가정합시다. 상대방이 대답해요. “길상면 보리고개로에 삽니다.” 보리고개로? 거기가 어딘데? 그런데 상대가 “길상면 선두리에 살아요.” 그러면, 아, 선두리, 금방 알잖아요.


문화유산의 이름과 해당 설명 등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번 주소가 사용됩니다. 우리 사례를 보지요. 강화읍 월곳리에 있는 월곶돈대!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갑곶돈대! 역시나, 어색합니다. 갑곶돈대 안에 천연기념물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이 탱자나무의 정식 이름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라고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