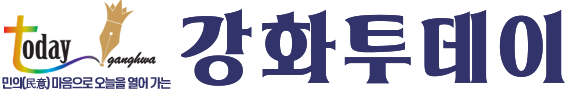“동네 건달인 ‘종술’은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완장을 찬 뒤 안하무인으로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타지를 떠돌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종술에게 완장은 금배지 이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낚시질하는 사람들에게 기합을 주고, 몰래 물고기를 잡던 친구와 그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읍내에 갈 때조차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급기야 저수지에 물고기를 잡으러온 최 사장(저수지 주인) 친척들에게 행패를 부려 감시원에서 해고당한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완장을 찬 채 저수지를 감시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던 중 가뭄이 심해지자 해소책으로 저수지 물을 빼려고 온 수리조합 직원에게까지 폭행을 가한다. 이 일로 경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자 술집 작부와 함께 마을을 떠난다. 그가 떠난 다음날 물이 빠진 저수지 수면 위에 완장이 둥둥 떠다닌다.”
윤흥길의 소설 ‘완장’의 일부분이다. 완장의 속성과 본질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개발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완장은 우리에게 특이한 존재로 다가섰다. 그것은 차기만 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돌변하는 야릇한 것이어서 인간관계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날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 순사, 한국전쟁 당시 잡자기 좌익이 된 사람, 학교 정문에서 복장검사를 하던 규율부 학생 등이 ‘완장’의 동의어처럼 여겨졌다. 좀 더 시기를 좁히면 귀족노조 간부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완장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대신 ‘갑질’이 대체재로 등장했다. 갑질은 원래 사전에 없던 신조어(新造語)다. 권리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甲)’과 비하하는 의미가 강한 우리말인 ‘질(행위)’이 합쳐져 강자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완장과 갑질, 두 단어의 조합이 왜 자연스로워 보이는가는 “완장을 찬 사람이 갑질을 한다”는 말을 떠올리면 된다.
갑질이라는 말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을(乙)’의 위치에 서본 경험이 많은 청년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10여년 전 인터넷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반짝했다가 곧 사라지는 유행어와는 달리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화에서는 물론 신문과 방송에도 자주 등장한다.
갑질이라는 용어 사용빈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절정을 이루더니 최근에는 아예 공식용어로 진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며, 정부 국민신문고에는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새로 나온 사전에도 ‘갑질’이 등재돼 있다. 사전에 비속어(갑질)가 버젓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일반화됐다는 얘기다. ‘갑질공화국’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된 우리 사회를 가리킨다. 갑질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자,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야 합니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특히 반장 등 리더를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지난해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나는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교장과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의 직위해제가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달 해당 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를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게 교사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경고만 내렸다가 문제가 되자 최근 직위해제했다.
갑질의 국제화까지 진행 중이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4일 EBS(교육방송) 강좌에서 “해외에서도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쓰여 영국 옥스퍼스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돈 많고 권력이 있어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갑질만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갑질의 속성은 특이하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질 한번 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음에도 갑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건 학습효과도 없는 모양이다. 갑질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벌어지지만 갑질은 계속된다. 오히려 황당하고 해괴한 신종 갑질까지 등장한다. 갑질의 진화인지 엽기화인지 헷갈린다
21세기 미스터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질 속성을 인간의 DNA와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주 찝찝한 느낌을 주는 이 말이 언제쯤 사라질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